국내 체류 외국인 270만명(2025년 기준). 인구의 5%를 넘어선 이 수치는 한국이 이미 OECD 기준 다문화 국가의 초입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엄중한 신호다. 학교 교실에서, 거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이웃을 마주하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풍경이 됐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자문해야 한다. 이 거대한 인구사적 변화를 감당할 ‘사회적 준비’가 단 한 뼘이라도 되어 있는가.
그간의 다문화 정책은 사실상 ‘시혜적 관리’라는 행정 편의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일회성 체험 행사를 마련하고 단기적인 지원책을 늘리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전히 현장의 실상은 이 평온한 지표들을 부순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운용되는 고용허가제가 현장에선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 임금 체납을 숙명처럼 견디게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병원비가 무서워 출산을 망설이는 산모 또한 우리 곁에 있다. 이들이 내뱉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호소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처절한 항변이다.
필자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록은 단순히 외국인의 고충을 대변하거나 연민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환상 뒤에 숨어 애써 외면해 온 사회적 균열을 직시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탱할 공동체의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도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주민의 적응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상상하는 방식에 있다.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불러 쓰고, 돌아서서는 ‘이방인’으로 밀어내는 이중적 태도가 여전하다. 교실 안팎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다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존재한다. 언론과 대중의 시선 속에서도 외국인의 얼굴은 종종 잠재적 범죄의 상징으로 소비되곤 한다.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 곁의 이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왜 법과 제도는 사람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가. 왜 통역은 존재하되 이해는 닿지 않는가. 본지는 앞으로 24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교실과 병원, 법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 규칙 중심 행정이 놓치고 있는 ‘사람’의 자리를 추적할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 사회를 함께 일구는 ‘협력의 주체’로 세우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문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현실이다. 준비되지 않은 혼란은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공동체의 결속을 해칠 뿐이다. 공존은 말의 성찬(盛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내국인의 인권 또한 온전할 수 없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수용을 넘어 공존의 문법을 새로 쓰는 일, 그것이 270만명 외국인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음 장은 갈등과 분열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차대한 질문의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 손현식 - 이노바저널 논설위원 - 한국외국인지원센터 (KFAC) 센터장(대표이사) - ‘낯선이웃과 함께 걷는 길-미래세대를 위한 공존의기록’ 저자 - 한국자유총연맹 국민통합분과 자문위원 - (재)한미동맹평화공원 사무처장 - FIABCI 한국대표부 글로벌협력센터 센터장/이사 - KFNA 한국인&외국인연합회 회장 - (재)외국인차별금지재단 준비위 초대이사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총동문회부회장
♦한국외국인지원센터(KFAC)를 이끌며 외국인과 다문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성장할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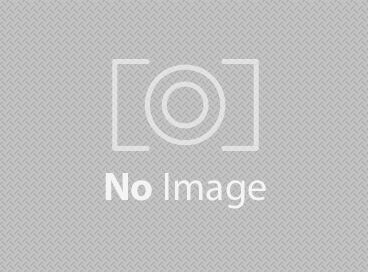 AI 혁신 물결: xAI의 세계 모델, OpenAI GPT-5 업데이트, Hugging Face 오픈소스 NLP 모델 출시
2025년 말, AI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의 연이은 발표가 이어지며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xAI의 로보틱스용 물리 세계 이해 모델 개발, OpenAI의 GPT-5 시리즈 업데이트, 그리고 Hugging Face의 맞춤형 NLP 오픈소스 모델 출시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발전은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적 적용을 촉진할 ...
AI 혁신 물결: xAI의 세계 모델, OpenAI GPT-5 업데이트, Hugging Face 오픈소스 NLP 모델 출시
2025년 말, AI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의 연이은 발표가 이어지며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xAI의 로보틱스용 물리 세계 이해 모델 개발, OpenAI의 GPT-5 시리즈 업데이트, 그리고 Hugging Face의 맞춤형 NLP 오픈소스 모델 출시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발전은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적 적용을 촉진할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6, 코엑스서 예술과 기업의 만남 성황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6, 코엑스서 예술과 기업의 만남 성황
 [손현식 칼럼] 270만 외국인 시대, ‘함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
[손현식 칼럼] 270만 외국인 시대, ‘함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
 할리우드 배우노조, 스튜디오 측에 새 반대 제안 테이블에 올리다
할리우드 배우노조, 스튜디오 측에 새 반대 제안 테이블에 올리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된 사랑… 특별한 결혼의 여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된 사랑… 특별한 결혼의 여정

 목록
목록









